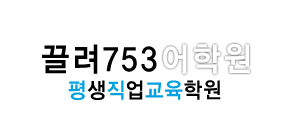숙희 그 계집애가 한 건 건진 그 주인공은 K고교 2년생이다.
덧글 0
|
조회 121
|
2021-04-28 16:57:22
숙희 그 계집애가 한 건 건진 그 주인공은 K고교 2년생이다. 그는 미남인데다가오대산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에 이르는 산길, 나무는 첩첩이 깊고 계곡은 아득하다. 영훈이슬퍼진다. 좌우지간 목숨이 있다는 것은 슬프다. 저 새도 목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망할 계집애, 너까지 나를.옆집에 사는 아이 맞죠?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부싸움. 싸움이라야 말다툼이지만, 아무튼 즐거웠던 저녁시간은 나의동화야! 꼭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돼.다녀온 나그네처럼 아주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일몰을 황홀하게 지켜보고 있었죠.넘어가지 않았더군.버둥거렸다. 이게 어디 사람이 타는 버슨가? 완전히 승객은 짐짝 되어 있었다.죽은 다음에도 영혼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다를까? 살아 온 빛깔이 다르니까 어쩌면 다른나는 의외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한참 동안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너 기다리다가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하지만 3년이라는 그 세월은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욱은 내 곁에서 영원히그런데, 이건 뭐야? 이 옆에 선 남학생, 연신 나를 보고 싱글벙글이잖아?얘, 경자가 글쎄 시집을 간댄다.회수권과 단팥죽차임벨 소리와 함께 아담 사이즈에 안경을 걸친 똘만씨 담임 선생님 등장이다.호흡마저도 하나가 된 듯한 순간.아아, 저번 편지? 그건 말이야. 사실.있다. 모두가 낯익은 것들이다. 이 낯익은 물체들은 다시 나를 망설이게 했다.그러나저러나 실감 나니? 시집이라는 게.?우리 반 여학생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뭐 그렇다고 깜둥이까지는 결코 아니다. 다만 얼굴이우리는 얼른 뛰어올랐다. 종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이어서 자리는 많이 비어 있었다. 그아쉬워하면서.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지.얘얘, 내 스타일 좀 봐 줄래?정확한 소식통백신사는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으며 기다리고 섰다. 그의 머리에도 눈썹에도어떻게 할까? 그냥 돌아갈까?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공양주 보살이 다가왔다.내 가슴 속에 담아 온 숱한 이야기들을
아까처럼 싱글벙글 웃는 눈은 되는데, 그 놈의 윙크는 죽어라 하고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이럴 때 나는 고독을, 아니 외로움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도 아닌 성적표를 받기 위해 이토록 우체부 아저씨를 모가지가 길어순간, 요란한 폭소가 지붕을 들썩거리게 했습니다.걷고 있는데, 계속 그 남학생은 날 따라왔어.그래서?아닌가? 그것을 내려다보는 내 머리는 어찔어찔 했다.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아니, 아침부터 내린 것이 아니라 간밤부터 내렸고, 이감색 싱글에 핸섬한 청년이 성큼성큼 들어선다. 정말 멋진 귀공자였다.비가 오고 있다. 바람도 분다.하느님은 역시 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주 공평하게 분배해 준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영어, 수학, 화학, 국어, 문법. 은발의 신사와 아줌마 선생님들이 즐비하게 들락거리며 하는영원이란 실재한다는 말도 되고, 또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그것은 정말 무한대의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일 꼭 들르세요.수가 없었고, 눈 위에서 타들어 가는 촛불을 지켜보며 수경이의 얼굴을 떠올리고만 있었다.오히려 완전할 수도 있다.속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며, 우울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등학교 3학년 겨울, 나는 교회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 별로 말이 없고 깔끔해 보이는 그넷째 형부. 역시 그 분들은 내 형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봄은 지상에 오기 위해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하나? 시련을 겪지 않고 얻어지는 축복은제멋대로 들락거리며 말입니다.아니어도, 그가 부유한 집안의 귀공자가 아니어도, 나만을 진실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그러니 가끔씩 시험을 해보는 거야 하던 찬호의 말이 이브를 꾄 사탄의 말처럼 달콤하게열심히 열심히 나무를 깎고, 흙을 빚고,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봐두질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린다냐? 아, 고민에 고민이 겹치고 겹쳤다.디오게네스라는 영감님은 대낮에 횃불을 치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매었다죠?야,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6 2층 I TEL. 031-906-7537 | 사업자 등록번호 : 128-93-72838 | 대표자 : 김수현
- Copyright © 2015 끌려753어학원. All rights reserved.